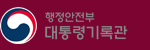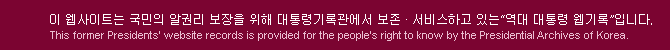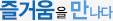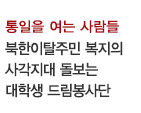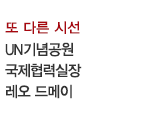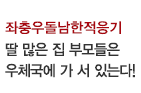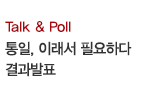2년 만에 하나원 출신의 같은 기수를 만난 A씨. 그 사이에 큰 변화가 눈에 띄었다.
“젊은 여자들은 다 혹들을 안고 왔더라고. 너네 2년 사이에 참 발전했다 그랬지.”
북한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모양새를 ‘네 볼에 붙은 혹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젊은 여자들은 대부분이 아이를 하나씩 안고 나오고, 또 어엿하게 취직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았다며 흐뭇해하던 A씨. 그녀보다 먼저 탈북해서 정착한 A씨의 딸도 내년 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 아직 성별을 모른다는 A씨에게 손자가 좋을 지 손녀가 좋을 지 물었다.
“북한에서는 ‘아들 많은 집 부모들은 기관 정문에 가서 서 있고, 딸 많은 집 부모들은 우체국에 가서 서 있는다’는 말이 있어. 또 아들 많고 딸 없는 집 부모는 ‘국제고아’라고도 하거든.”
무슨 말일까? 아들은 보안소 같은 기관에 잡혀 들어갈 까봐 늘 걱정이지만, 딸은 선물을 많이 보내오니까 좋다는 뜻이다.
“옛날에나 아들아들 했지, 부모 섬기는 건 딸들이 나아. 아무래도 아들은 제 가정에 파묻히니까 신경을 더 못써주는 것 같아.”
상황이 이렇다면 북한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도 꽤 높을 것 같다.
“젊은 여자들은 다 혹들을 안고 왔더라고. 너네 2년 사이에 참 발전했다 그랬지.”
북한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모양새를 ‘네 볼에 붙은 혹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젊은 여자들은 대부분이 아이를 하나씩 안고 나오고, 또 어엿하게 취직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았다며 흐뭇해하던 A씨. 그녀보다 먼저 탈북해서 정착한 A씨의 딸도 내년 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 아직 성별을 모른다는 A씨에게 손자가 좋을 지 손녀가 좋을 지 물었다.
“북한에서는 ‘아들 많은 집 부모들은 기관 정문에 가서 서 있고, 딸 많은 집 부모들은 우체국에 가서 서 있는다’는 말이 있어. 또 아들 많고 딸 없는 집 부모는 ‘국제고아’라고도 하거든.”
무슨 말일까? 아들은 보안소 같은 기관에 잡혀 들어갈 까봐 늘 걱정이지만, 딸은 선물을 많이 보내오니까 좋다는 뜻이다.
“옛날에나 아들아들 했지, 부모 섬기는 건 딸들이 나아. 아무래도 아들은 제 가정에 파묻히니까 신경을 더 못써주는 것 같아.”
상황이 이렇다면 북한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도 꽤 높을 것 같다.

“원래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부엌일을 많이 해. 요즘에는 여자들보다 더 가사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여자들이 해 넘어갈 때까지 계속 장마당에 앉아있는데 언제 집안일을 보겠어? 여자들이 워낙 나따뜨니까(나돌아 다니니까), 그리 안하면 못사니까… 어쨌든 북에서도 여자들이 승하는 것만은 사실이야.”
물론 남아 여아 선호도나 가정 분위기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생활이 점점 곤란해지면서 북한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만은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다.
“삼태자라면 모를까 요즘엔 둘 정도? 셋부터는 많다고 해. 로년(노년)들이야 그 전에 멋모르고 많이 낳았지.”
삼태자란 세쌍둥이를 뜻하는 말로, 북한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이라며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을 권장하고, 세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평양 최고의 산부인과인 ‘평양산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물론 남아 여아 선호도나 가정 분위기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생활이 점점 곤란해지면서 북한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만은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다.
“삼태자라면 모를까 요즘엔 둘 정도? 셋부터는 많다고 해. 로년(노년)들이야 그 전에 멋모르고 많이 낳았지.”
삼태자란 세쌍둥이를 뜻하는 말로, 북한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이라며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을 권장하고, 세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평양 최고의 산부인과인 ‘평양산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얼마 안 있으면 겨울의 한 가운데, 바야흐로 동지다. 북한에도 동지팥죽이 있는 지 궁금했다. A씨는 “동지죽 해먹는 풍습이 있긴 한데, 동지오그랭죽이라고 불러”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내 고향은 감자만 심는 데니까 까리, 감자를 막 갈아서 감자오그랭죽을 만들어 먹어요. 그 안에 쇠때돈(동전)을 넣기도 하는데 딱 씹으면 어우~ 기분이 좋거든요.”

지난 호 민주평통웹진 ‘e-행복한통일’에 북한 요리로 나갔던 감자막가리만두도 자주 만들어 먹는지 물었더니 그런 이름도 모르고, 그런 걸 해먹을 수도 없단다. 내친김에 이번호에 나가는 ‘가릿국밥’ 해장국은 아느냐고 물었더니 술 마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장국이 있겠냐며 되묻는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B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 해장을 위해서 엄마가 감자장물을 해줬다”고 한다. 된장을 풀고 감자를 썰어서 끓인 국으로 아마 감자 된장국 정도 되는 모양이다.
B씨는 “우리 고향은 감자도 있고 산나물도 있어서 굶어죽지는 않았을 텐데 백도라지 때문에 다 녹아났어요. 70% 면적에 몽땅 백도라지를 심었으니까”라고 말한다. 감자가 주산지인 이곳에 어느 날 ‘지도자’가 ‘이 고장은 산골이니 백도라지를 심으라’고 지시한 것.
B씨의 말에 따르면 백도라지를 심으면 다음해 콩이나 감자를 심어도 아무것도 제대로 수확할 수가 없다고 한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민요도 있는데 왜 백도라지가 말썽인가 싶었다. 알고 보니 백도라지는 하얀색 양귀비, 즉 아편을 에둘러 하는 말이었다.
“우리가 백도라지 때문에 10년을 녹아 났잖아요. 후에는 안 심게 했대요.”
B씨는 “우리 고향은 감자도 있고 산나물도 있어서 굶어죽지는 않았을 텐데 백도라지 때문에 다 녹아났어요. 70% 면적에 몽땅 백도라지를 심었으니까”라고 말한다. 감자가 주산지인 이곳에 어느 날 ‘지도자’가 ‘이 고장은 산골이니 백도라지를 심으라’고 지시한 것.
B씨의 말에 따르면 백도라지를 심으면 다음해 콩이나 감자를 심어도 아무것도 제대로 수확할 수가 없다고 한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민요도 있는데 왜 백도라지가 말썽인가 싶었다. 알고 보니 백도라지는 하얀색 양귀비, 즉 아편을 에둘러 하는 말이었다.
“우리가 백도라지 때문에 10년을 녹아 났잖아요. 후에는 안 심게 했대요.”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 C씨는 한국에서 조선족 시누이와 조우한 적이 있다.
“1998년도에 탈북해서 조선족에게 시집을 갔는데 시누이가 나한테 그랬어요. 중국에 와서 쓰레미(쓰레기)장만 들춰먹어도 너네(북한)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요. 거지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또 김정일이를 막 욕하더니 항미원조(6ㆍ25 한국전쟁의 중국식 명칭)는 남한의 북침이 아니라 김일성이 먼저 냅다챘다 이러더라구요. 그땐 남침인지 북침인지 몰랐을 때니까 괜히 벨(화)만 났지요.”
“1998년도에 탈북해서 조선족에게 시집을 갔는데 시누이가 나한테 그랬어요. 중국에 와서 쓰레미(쓰레기)장만 들춰먹어도 너네(북한)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요. 거지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또 김정일이를 막 욕하더니 항미원조(6ㆍ25 한국전쟁의 중국식 명칭)는 남한의 북침이 아니라 김일성이 먼저 냅다챘다 이러더라구요. 그땐 남침인지 북침인지 몰랐을 때니까 괜히 벨(화)만 났지요.”

그러자 2년 전 탈북한 A씨는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말을 북한에서도 들었다고 했다.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지만 북한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한다.
한편, C씨가 시누이와 사이가 틀어지게 된 데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 신분이 발각돼 입북된 후 구사일생으로 다시 중국에 재탈북 할 수 있었는데, 조선족 남편과 그 가족들은 C씨를 모른 척 했다. 결국 그녀는 명태 배를 가르거나 온갖 궂은 일을 다 해가며 중국에서 살다가 겨우 한국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후 한국에서 정착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C씨의 소식을 들은 시누이는 그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지만 ‘엎어놔도 데벼놔도 양심이 바르게 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C씨는 그들을 쉽게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탈북 과정에서 거꾸로 가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동창모임에 다녀온 A씨는 태국에서부터 함께 온 젊은 D씨를 2년 만에 만났다.
“나보고 시엄마 시엄마 부르면서 그렇게 잘하던 애가 있었거든. 이번에 만나면 노래방도 가자고 했더니 그 애가 그러더라고. 노래방 가자는 설계(제안)는 엄마가 내놓고, 엄마가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막 아쉬워하는 거야. 앞으로 자주 보자고 하고 나왔지 뭐.”
모임에서 일찍 나와 집으로 돌아온 A씨. 딸이 돌아올 시간에 딩동~ 벨이 울렸다. 딸인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택배 배달원이 서 있다. 커다란 소포를 한아름 안겨주는 그에게 A씨는 평소에도 “들어와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라고 말한다. 그 때마다 딸은 “물 한잔 건네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들어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시느냐”며 항상 타박을 한다. 하지만 A씨는 “자기 일이니까 고마워 할 필요가 없다지만, 이렇게 뭘 자꾸 갖다주니 당연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기지”라고 대꾸하곤 한다.
택배 배달원에게도 밥 한 끼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어 하는 A씨의 마음에서 따뜻한 연말을 느껴본다.
한편, C씨가 시누이와 사이가 틀어지게 된 데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 신분이 발각돼 입북된 후 구사일생으로 다시 중국에 재탈북 할 수 있었는데, 조선족 남편과 그 가족들은 C씨를 모른 척 했다. 결국 그녀는 명태 배를 가르거나 온갖 궂은 일을 다 해가며 중국에서 살다가 겨우 한국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후 한국에서 정착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C씨의 소식을 들은 시누이는 그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지만 ‘엎어놔도 데벼놔도 양심이 바르게 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C씨는 그들을 쉽게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탈북 과정에서 거꾸로 가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동창모임에 다녀온 A씨는 태국에서부터 함께 온 젊은 D씨를 2년 만에 만났다.
“나보고 시엄마 시엄마 부르면서 그렇게 잘하던 애가 있었거든. 이번에 만나면 노래방도 가자고 했더니 그 애가 그러더라고. 노래방 가자는 설계(제안)는 엄마가 내놓고, 엄마가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막 아쉬워하는 거야. 앞으로 자주 보자고 하고 나왔지 뭐.”
모임에서 일찍 나와 집으로 돌아온 A씨. 딸이 돌아올 시간에 딩동~ 벨이 울렸다. 딸인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택배 배달원이 서 있다. 커다란 소포를 한아름 안겨주는 그에게 A씨는 평소에도 “들어와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라고 말한다. 그 때마다 딸은 “물 한잔 건네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들어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시느냐”며 항상 타박을 한다. 하지만 A씨는 “자기 일이니까 고마워 할 필요가 없다지만, 이렇게 뭘 자꾸 갖다주니 당연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기지”라고 대꾸하곤 한다.
택배 배달원에게도 밥 한 끼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어 하는 A씨의 마음에서 따뜻한 연말을 느껴본다.
<글. 기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