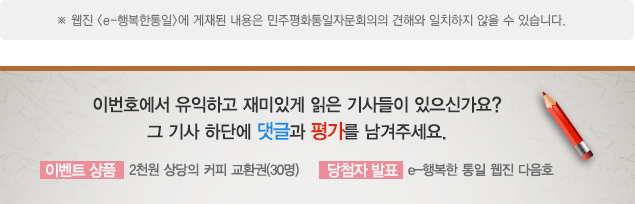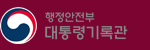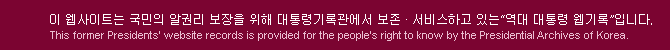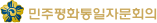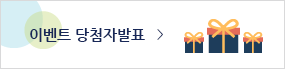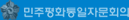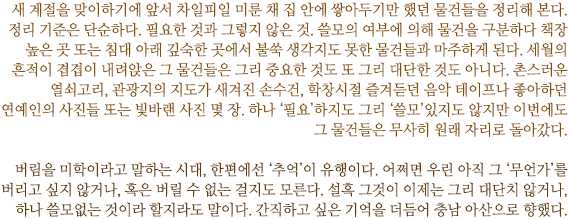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나란히 몸을 뉘인 진청색 기와를 따라 소담이 쌓여있던 눈송이가 녹아내린다. 처마 안쪽에 서서 바라보자면, 영락없이 비오는 날의 풍경이다. 그 몇 방울 물기를 피하겠단 요령을 부리다 발길을 멈췄다. 그것 좀 맞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 것조차 즐거워 깔깔거리며 웃었던 날도 있었는데 말이다. 평일의 한낮임에도 현충사 주변은 제법 소란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은 이순신 장군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 했고, 학창시절 수학여행이나 신혼여행으로 왔었을 법한 중년부부는 그 시절을 추억 하느라 바빠 보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위인이자,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손꼽는 명장 충무공 이순신. 그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지 딱 100년 뒤인 숙종 32년, 장군의 넋과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 바로 현충사다. 현충사란 편액 역시 숙종 임금이 친히 내린 것이다. 하지만 현충사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충무공의 사당이란 것만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향불 하나 피워 올리지 못했다가, 결국 후손들의 재정악화로 은행 경매로 넘어갈 뻔한 이곳을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새로 단장했다. 그리고 해방 후 사당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지금의 현충사로 자리하게 됐다.
우리나라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위인이자,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손꼽는 명장 충무공 이순신. 그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지 딱 100년 뒤인 숙종 32년, 장군의 넋과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 바로 현충사다. 현충사란 편액 역시 숙종 임금이 친히 내린 것이다. 하지만 현충사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충무공의 사당이란 것만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향불 하나 피워 올리지 못했다가, 결국 후손들의 재정악화로 은행 경매로 넘어갈 뻔한 이곳을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새로 단장했다. 그리고 해방 후 사당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지금의 현충사로 자리하게 됐다.
핍박과 설움의 세월 그리고 막상 해방은 했지만 삶이 막막해, 서로 다른 목소리로 우왕좌왕해야 했던 그 시대 속 현충사는 국민의 희망을 한 데 묶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곳이다. 그래서 일 것이다. 사자(死者)를 위한 공간.
하지만 장군의 기개를 닮았다 하여 곳곳에 심어진 사철 푸르른 소나무 아래를 거닐다보면, 그 어느 곳보다 생기(生氣)가 넘친다.
충무공의 영정을 모신 본전으로 들어서면 이순신 장군의 영정과 함께 일생을 기록한 십경도가 있으며, 유물관에는 충무공의 일기인 ‘난중일기’와 ‘서간첩’을 비롯해 친필 검명이 새겨진 장검 두 자루, 각종 유품과 무기, 거북선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공이 결혼 후 무과에 급제하기 전까지 생활했던 옛집 터와 활터 등도 복원되어 있어 거닐기 좋다.


 추억이란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단어가 있다. 바로 향수(노스탤지어)다. 향수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말한다. 그 시절,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리운 추억이 됐다.
추억이란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단어가 있다. 바로 향수(노스탤지어)다. 향수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말한다. 그 시절,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리운 추억이 됐다.
켜켜이 쌓아올려진 돌멩이 중에는 같은 모양새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그 자리가 제 것 인양 천연덕스럽게 자리를 잡은 돌들이 길을 따라 담을 이룬다. 돌담이라고는 하지만 요령껏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면 마당 안의 정경이 그대로 보일만큼의 나지막함. 그저 사람이 다니는 좁은 길과 집을 구분 짓기 위한 역할이 전부일 것 같은 돌담을 따라 걷다보니 싸리나무로 만든 대문이 보인다. 짚을 엮어 올린 지붕이나 일일이 쌓아올렸을 돌담, 싸리나무를 꺾어 얼기설기 엮은 대문까지. 어느 것 하나 집 주인의 손을 타지 않은 것이 없었을 텐데도 영 허술해 보여, 괜한 참견을 하게 된다.
 그 시절이라고 남의 물건을 탐하던 이가 없었을 것도 아닌데 애써 들어가자면 못 들어 갈 것도 없을 만큼 틈이 많다. 바늘 하나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는 요즘 집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 하지만 그 틈새로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들고 났을 것이란 생각이 미치자, 걱정이 부질없어 진다.
그 시절이라고 남의 물건을 탐하던 이가 없었을 것도 아닌데 애써 들어가자면 못 들어 갈 것도 없을 만큼 틈이 많다. 바늘 하나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는 요즘 집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 하지만 그 틈새로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들고 났을 것이란 생각이 미치자, 걱정이 부질없어 진다.
그러고 보니, 이 오래된 마을의 계절은 유독 선명하게 보인다. 야트막한 비탈길을 따라 눈이나 얼음이 녹은 물이 흐르고, 그렇게 흐르기 시작한 물은 겨울 냉기에 메말랐던 농토를 적신다. 8km에 이르는 돌담 사이, 사이에 터를 잡은 물이끼며, 담쟁이 넝쿨도 조금씩 생기를 띄고, 담장 너머 자리한 목련, 앵두나무, 감나무, 산수유나무 등의 가지마다 언뜻 푸른빛이 맴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 덧 새 계절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아산 시내에서 남쪽으로 8km 쯤 떨어진 설화산 동남쪽 기슭에 자리한 외암민속마을(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은 조선 선조 때부터 예안 이 씨 집안이 정착해 집성촌을 이룬 곳이다. 성리학의 대학자인 외암 이간 선생을 배출해 흔히 외암마을로 불리는데, 참판댁과 건재고택, 외암정사 등 문화재급 고택은 물론 충청지방 고유의 거주문화를 엿볼 수 있는 초가와 정원 등도 이 마을의 자랑이다. 특히 이곳의 매력은 아직 사람이 거주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은 보존이나 관광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과는 또 다른 생기가 넘친다. 매 끼니때가 되면 골목마다 구수한 밥 냄새와 나무 장작 냄새가 폴폴 풍기고, 밭에는 한 해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그래서일까. 100여 년이 훌쩍 넘었을 고택들을 마주하는데도 하나 낯설지가 않다. 오히려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의 정경마냥 친숙하기까지 하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지도 모른다. 달라졌다면 아마 바람이 지나는 그 작은 틈바구니조차 메우지 못해 안달 난 우리네 마음 정도가 아닐까.


 그 유명한 공세리성당은 평범한 시골마을 옆, 언덕마루에 서있었다.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로 손꼽힌다는 곳. 수 없이 많은 영화와 방송에 출연해, 그 이름만큼은 웬만한 유명인사보다 더 유명하다는 성당은 사실 상상만큼 거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흘러가는 계절 속 묵묵히 자리를 지탱해 온 350여 년 수령의 고목들과 자연스레 조화를 이룬 성당의 붉은 외관을 보고 있자면, 그 옛날 이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쏟았을 정성과 기원에 감탄하게 된다.
그 유명한 공세리성당은 평범한 시골마을 옆, 언덕마루에 서있었다.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로 손꼽힌다는 곳. 수 없이 많은 영화와 방송에 출연해, 그 이름만큼은 웬만한 유명인사보다 더 유명하다는 성당은 사실 상상만큼 거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흘러가는 계절 속 묵묵히 자리를 지탱해 온 350여 년 수령의 고목들과 자연스레 조화를 이룬 성당의 붉은 외관을 보고 있자면, 그 옛날 이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쏟았을 정성과 기원에 감탄하게 된다.
종교를 떠나, 먼 길 찾아 온 이를 반겨주는 성당은 실내 역시 특별한 미사가 없는 한 문을 열어둔다. 다만 우리나라 천주교 순교성지 중 한 곳인 만큼 실내에서는 정숙하는 것이 기본 예의이며, 성당 본관 외에도 전시실이나 박물관 등도 둘러볼 만하다.
떠나기 전 짐작했듯 아산은 엄청난 볼거리가 있는 지역은 아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수학여행과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던 도심은 평소 잊고 지냈던 추억의 물건들처럼 조금 빛바래고, 간혹 세월의 흔적이 뽀얗게 내려앉아 있기도 했다. 그래도 좋았다. 아니 그래서 좋았다. 그저 걷고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추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것도 있다.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