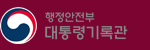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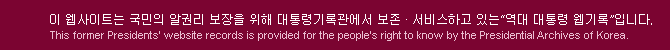 |
즐거운 통일 | 여행이 문화를 만나다
이제 그대가 꽃 피울 차례 전남 구례

봄이 나비처럼 내려앉아
깨달음이 된다, ‘사성암’
솔직히 덜컹이는 버스에 앉아 꼬불꼬불 산길을 오를 때만해도 이 무슨 사서하는 고생인가 싶기도 하다. 지리산 능선 사이 비죽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오산 중턱, 섬진강을 코앞에 두고 깎아지른 산비탈 위로 갸우뚱 서있는 암자는 그곳에 닿기까지의 공을 떠올리자면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도리어 강 건너편에서 멀리 바라본 암자의 모습이 더 이채롭다 여길 정도.
하지만, 그 곳에서 내려다 본 풍경은 또 다르다. 겹겹이 포개진 지리산 능선마다 아련히 피어오른 봄의 기운이 다정한 강물 위로 내려앉는다. 낯가림이 심해 파르르 떨리는 강의 비늘이 눈부셔 가늘게 뜬 시선을 떨어트리면, 구례와 곡성의 넓은 논밭과 낮은 지붕을 인 민가들이 듬성듬성 마을을 이룬 모습이 차례로 보인다. 햇살이 흩뿌려진 남도의 봄은 친근하고 상냥하다. 아마 지리산 자락을 타고 올랐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남도의 얼굴이다.



좁은 바위 위에 세워진 암자에는 마당 대신 가파른 돌계단이 있다. 600년 된 귀목나무며, 소원바위 등도 이 계단을 올라야 닿는다. 또 고승인 원효대사가 바위에 손톱으로 새겼다는 마애여래입상 역시 볼 수 있다. 사성암이란 암자의 명 역시 원효대사를 비롯해 의상대사, 고선국사, 진각구사 등 네 명의 고승이 수도했다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세상이 온통 발그레 물들어가는 해질 무렵, 멀리 시선을 두고 있자면 과연 교과서에서나 보던 고승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에 대해 알 법도 싶다. 하지만, 작고 사소한 깨달음이 삶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삶은 벅차기만 하다.
나무가 꾸는 봄날의 샛노란 꿈,
‘산수유 마을’
단조로운 일상을 악착스레 버티느라 굳어진 어깨를 두들기며, 다시 겹겹이 포개진 지리산 능선을 따라 다정히 굽이쳐 흐르는 강물 곁을 거닌다. 그나마 그 온화한 온기에 취해 걷다보니 단단했던 어깨의 힘이 빠지고, 문득 돌아본 야트막한 돌담 아래는 온통 노란 꽃구름이다.
도통 눈에 담아서는 생강나무와 구분 지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라 까치발 들어 코끝을 대본다. 옳거니 알싸한 생강향이 없으니 네 이름은 산수유구나. 사방 봄맞이 꽃 잔치가 벌어진 남쪽 지리산 자락 아래, 산수유는 사실 한눈에 길손의 걸음을 붙들
만큼 화려한 맛은 없다. 대신 소담한 꽃송이는 꼭 두어 번씩 뒤돌아보게 하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산수유는 꽃이 아니라 나무가 꾸는 꿈’이라고 했던가. 11만 7,000여 그루가 꾸는 노란 꿈 그늘 아래 지리산 자락에서 시작해 섬진강으로 내달리는 물줄기가 청명하게 흐른다. 청명하고 보드라운 꿈속의 봄이다. 흐드러진 꽃그늘 아래 잠시 쉬어가자니, 이곳이 무릉도원인가 싶다.
하지만, 신선이 되지 못한 중생인지라 제법 길어진 낮 시간 동안 봄의 꽁무니만 쫓았더니 금세 속이 출출해진다. 섬진강에 왔으니 메뉴는 고민할 필요 없이 다슬기 국이다. 허름한 동네 식당에 들어가도 섬진강 맑은 물에서 자란 다슬기를 직접 줍고 손으로 깠다는 주인 할머니의 자랑은 끝이 없다. 아닌 게 아니라, 맑은 국물의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라, 앉은 자리에서 한 대접 뚝딱 해치우니 뱃속까지 뜨끈해진다.
이 봄이 전한 희망,
우리도 꽃이었다,‘쌍산재’
배가 부르니 이 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산책이라도 해볼까 싶어, 구례의 대표적인 한옥마을인 상사마을로 향한다. 상사마을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고택 쌍상재는 안채와 사랑채, 정자, 사당, 장독대 등의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다, 너른 내부에는 대나무 숲과 차밭까지 갖추고 있다.


‘연초록 숲 한가운데 터를 잡은 고택의 정경은 단아하고 차분하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청렴히 자연을 벗 삼았다는 선조의 생가를 그 후손들이 아껴 살고 있다고 하니 과연 세월의 손때로 인해 윤이 반질반질 나는 마루 한 장에도 삶의 생생함이 녹아난다. 잘 손질된 대나무 숲의 바람을 즐기다 뒷문을 찾아 열어보니 거짓말처럼 이번엔 마을의 깊은 저수지가 눈앞에 드러난다. 저수지 주변으로도 온통 푸릇한 봄의 기운이 가득하다.

‘이만하면 됐다’ 싶을 만큼 더 없이 봄에 취해 봄을 만끽했던 여행길.
물론, 이제 돌아가야 할 현실은 채 봄을 맞이하기 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의 봄 햇살로나마 노곤해진 몸과 마음은 조금 더 ‘봄’을 기다릴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봄이 찾아온다면 어쩌면 이번에야 말로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라 믿어본다. 우리도 꽃이었다.


<글: 권혜리 / 사진: 김규성 / 사진제공: 구례 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