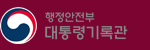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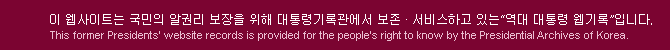 |
96호 > 성공시대
성공시대 / 이정옥 전남 신안군 내호리 이장

윤완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목포역에서 차로 40여 분을 달려 전남 신안군 송공리 선착장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 30분 걸려 도착한 곳이 신석 선착장이었다. 1004개의 섬이 있다 해 ‘천사의 섬’이라 불리는 신안군. 향긋한 바다 내음에 취하고 싶었지만 아직 그가 살고 있는 전남 신안군 안좌도의 내호리까지 가려면 좀 더 남았다. 다시 차를 몰아 40분을 더 가니 저 멀리 소에게 여물을 주러 나오는 주인공이 보였다. 바로 최초의 북한이탈주민 출신 마을 이장 이정옥(48) 씨다.
2003년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가 급히 이륙했다. 비행기엔 북한군 대대지도원 출신 외화벌이 일꾼이 앉아 있었다. 그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는 7년간 그 나라 인근 공해상에서 조업하며 외화를 벌어 북한에 보내는 일을 했다. 2002년 그 일을 관리하던 장성택이 국가 예산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자 그를 포함한 외화벌이 일꾼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갑자기 뒤바뀐 삶에 혼란스러웠던 이 씨의 한국 생활이 시작됐다. 목포에 정착한 이 씨는 얼마 뒤 TV에서 초대형 태풍 매미로 130명의 인명 피해가 난 현장을 목격한다. 군인과 대학생, 회사원들이 피해 주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 돕는 모습은 그가 북한에서 배운 ‘괴뢰 한국’과 전혀 달랐다. 그 광경이 이 씨의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을 줬다. 이 씨는 그 길로 목포 사회복지관으로 달려갔다.
태풍에 나자빠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성금을 냈다.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목욕 봉사,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했다. 당시 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북한을 탈출해온 사람이 봉사활동을 자원한 건 처음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대단하다”고 감탄했다고 한다.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 때 봉사를 하면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봉사가 나를 살게 해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랬던 그가 2004년 불현듯 캐나다로 떠났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북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사활동으로 남한 사회 뿌리 내려

4년 뒤 그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
“내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치고 나를 거기에 가둬버린 것이었어요.”
이 씨는 그 벽을 깨고 한국인으로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다. 목포에서 다시 양로원과 보육원을 돌며 봉사활동에 전념했다. 그때 인연을 맺은 사람이 자신의 조카를 소개해줘 결혼도 했다. 그리고 남편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안좌도 내호리에서 농사꾼으로 제2의 삶을 시작했다.
내호리 사람들은 처음에 그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길을 가다 밭을 매는 어르신이 보이면 같이 밭을 맸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이제 이 씨는 내호리 노인들을 모두 “엄마”, “아부지”로 부를 만큼 친숙해졌다.
“사흘만 안 보이면 엄마, 아부지 집에 가서 ‘엄마 살아계셔? 아부지 살아계셔?’ 하면서 확인해요. 어르신들 집에 수도가 얼면 ‘엄마 물 나와?’ 하며 물을 길어다드리고요.”
“사시는 날까지 아프지 말아야 한다”며 약 먹을 때를 챙기니 술 좋아하는 노인들은 “정옥이 쟤 앞에선 술도 못 먹어”라며 혀를 내두른다. 마을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 상가(喪家) 음식 장만도 이 씨 몫이다. 마을 여기저기서 “어디서 저런 복덩이 가시내가 굴러왔을까”라는 살가운 소리가 들려왔다.
매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 도시락 배달에도 빠지지 않았다. 안좌도의 노인회관 40곳에 매년 김장김치를 기부한다. 2012년엔 배추 850포기(2.5t)로 김치를 담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그 김치는 저소득층 이산가족들에게 전달됐다. 또 이 씨는 오갈 곳 없는 탈북 노인의 농촌 정착을 돕고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영농교육도 하고 있다.
그는 최근 마을 주민 50명 중 약 40명의 압도적 지지로 이장에 선출됐다. 북한이탈주민 중 첫 이장이 배출된 것이다. 이 씨는 마을 노인회관을 내호리의 어려운 홀몸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양로원으로 만들고 싶다는 이장으로서의 꿈을 밝혔다.
“농촌 고령화가 심각하니 자식 떠나보낸 뒤 어렵게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이 한참 동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노인들이 함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따뜻한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씨는 이제 내호리 밖에서도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고 뿌듯해한다.
“얼마 전 도시락 배달 봉사를 갔던 안좌도 다른 마을의 한 노인이 ‘야 내호(리)! 이제 내 동생 해도 되겄지?’ 하시더라고요. ‘우리’ 축에 끼워주겠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벅찼죠.”
“근데 잉”, “진짜 잉”, “그러요”라며 구성진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이 씨는 “한국의 시골에 사는 게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국엔 북한과 달리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란다. 삶의 기로에 섰던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이 나눔을 실천하는 마을 이장으로 거듭났다. 그를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먼저 온 통일미래’라는 말이 실감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