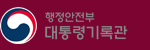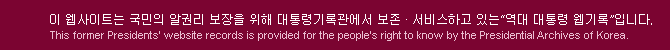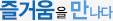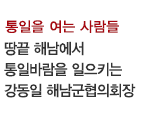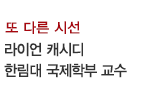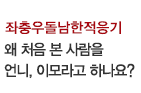“그저 판소리가 좋았어요. 무대 위에서 소리꾼이 노래를 하고, 고수가 북으로 장단을 맞추면, 관객들이 추임새를 넣어줘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걸
‘판을 짠다’고 해요. 그게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 무대를 모두 같이 만드는 거죠. 그게 좋아요.”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캐시디 교수는 심지어 스스로를 음치라 노래방도 안가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런 그가 판소리 소리꾼이 된 것은 순전히 스승인 소지영 명창의 권유 덕분이었다. 지난 2010년 중요무형 문화재인 성우향 명창의 제자이자 춘천지역에서 활동 중인 소지영 명창의 공연을 보고 판소리를 처음 접했고, 이후 소 명창의 권유로 판소리를 배우게 된 것.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캐시디 교수는 심지어 스스로를 음치라 노래방도 안가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런 그가 판소리 소리꾼이 된 것은 순전히 스승인 소지영 명창의 권유 덕분이었다. 지난 2010년 중요무형 문화재인 성우향 명창의 제자이자 춘천지역에서 활동 중인 소지영 명창의 공연을 보고 판소리를 처음 접했고, 이후 소 명창의 권유로 판소리를 배우게 된 것.
“판소리는 소리만으로 이야기의 희로애락을 다 표현하죠. 그런데 그 소리를 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제대로 소리를 알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녹아있는 한국의 역사, 문화, 정서를 다 배우고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다시 모르는 하나가 생겨요. 계속 배울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과정이 즐거워요.”

물론 배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더욱이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와 한자까지 읽고 이해하고 외워야 하니 두 배는 더 어렵다.
“단어란 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외워지지가 않아요. ‘심청가’를 배울 때 첫 대목에 삯바느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입에 붙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어렵죠. 그런데 재밌어요. 이제 3년 배웠는데 판소리는 한 10년 배워야 좀 배웠구나 한대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더 많은 거죠.”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책도 많이 봤다. 한국이란 나라를 설명할 때 곧잘 등장하는 ‘정(情), 흥(興), 한(恨)’을 영어로 설명한 글에는 한계가 있었다. 10여 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살면서도 알 듯 모를 듯 조금 난해했던 한국인의 정서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게 된 것 역시 판소리를 배우면서 부터였다.
“전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 ‘심청가’가 가장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와 달리 심청가 같은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눈을 보이기 위해서 임당수에 몸을 던지는 딸과 그 딸을 찾기 위해 헤매는 아비의 이야기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있잖아요. 내가 느껴야 알 수 있는 것. 한국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느껴야 아는 것.”
“단어란 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외워지지가 않아요. ‘심청가’를 배울 때 첫 대목에 삯바느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입에 붙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어렵죠. 그런데 재밌어요. 이제 3년 배웠는데 판소리는 한 10년 배워야 좀 배웠구나 한대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더 많은 거죠.”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책도 많이 봤다. 한국이란 나라를 설명할 때 곧잘 등장하는 ‘정(情), 흥(興), 한(恨)’을 영어로 설명한 글에는 한계가 있었다. 10여 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살면서도 알 듯 모를 듯 조금 난해했던 한국인의 정서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게 된 것 역시 판소리를 배우면서 부터였다.
“전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 ‘심청가’가 가장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와 달리 심청가 같은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눈을 보이기 위해서 임당수에 몸을 던지는 딸과 그 딸을 찾기 위해 헤매는 아비의 이야기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있잖아요. 내가 느껴야 알 수 있는 것. 한국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느껴야 아는 것.”


일주일에 한번 스승으로부터 사사를 받을 때면 학생으로 돌아간다는 캐시디 교수의 본업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다.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캐시디 교수는 사실 한국에 오기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교육자의 자질이 있는지 몰랐단다. 처음에는 1~2년 간 학생들을 가르칠 계획으로 한국행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과 한국의 매력에 빠져, 그 다음에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면서 한 해, 그렇게 세월이 흘러 벌써 15년이 됐다. 이제는 한국이 자신이 사는 터전이라고 말한다.
“한국문화 중에 정이 가장 좋아요. 그중에서도 이웃사촌이라고 하잖아요. 이웃끼리 가지는 정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 처가 쪽 외할머니 댁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동네에서 만난 어른들이 와이프가 누구 딸인지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정겹기도 하고 좋았어요.”
아파트 생활이 일상화 되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회문화로 사라져가는 한국의 정겨운 풍경이 아쉽다는 캐시디 교수는 그래서 일부러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곤 한단다.
“시장바닥에 물건 놓고 할머니들이 파시잖아요. 막 한 마디씩 하고 가끔이지만 외국인이라고 덤도 더 주시고요. 그런 모습이 정겹고 좋아서 시장을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문화 중에 정이 가장 좋아요. 그중에서도 이웃사촌이라고 하잖아요. 이웃끼리 가지는 정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 처가 쪽 외할머니 댁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동네에서 만난 어른들이 와이프가 누구 딸인지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정겹기도 하고 좋았어요.”
아파트 생활이 일상화 되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회문화로 사라져가는 한국의 정겨운 풍경이 아쉽다는 캐시디 교수는 그래서 일부러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곤 한단다.
“시장바닥에 물건 놓고 할머니들이 파시잖아요. 막 한 마디씩 하고 가끔이지만 외국인이라고 덤도 더 주시고요. 그런 모습이 정겹고 좋아서 시장을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전 남들이 ‘판소리 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이 좀 불편해요. 그냥 ‘판소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문화든 겉은 달라 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은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인이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문화차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한국사람들사이에도 심지어 가족 사이에도 문화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에요.”
남북한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알맹이는 같다는 것이다.
“남한사람, 북한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결국 남북만 빼면 한국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이 쉽게 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도 흥도 정도 공부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느끼고요? 뿌리가 같으니까요.”
판소리를 배우고 아끼는 사람으로 바람은 한국전통문화가 남북통일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란다.
“판소리 다섯 마당 북측 사람들도 다 알지 않나요? 같은 걸 공유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전통문화를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남북한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알맹이는 같다는 것이다.
“남한사람, 북한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결국 남북만 빼면 한국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이 쉽게 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도 흥도 정도 공부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느끼고요? 뿌리가 같으니까요.”
판소리를 배우고 아끼는 사람으로 바람은 한국전통문화가 남북통일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란다.
“판소리 다섯 마당 북측 사람들도 다 알지 않나요? 같은 걸 공유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전통문화를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책이요? 완창이요?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엔 자신이 배울 게 너무 많아서 그저 현재에 충실하고 싶다는 캐시디 교수. 다만 자신과 함께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 초등학생 아들 기인이와 가까운 시기에 무대에 오르고 싶단다.
“얼마 전 친구 아버님 칠순잔치에 기인이와 같이 갔는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노래 부르라니까 판소리를 부르더라고요. 다들 신기하고 기특하다고 용돈도 챙겨주고 하니까 부쩍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엔 저보다 더 잘 부른다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자신과 같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소리를 알려주고 싶단다.
“외국인이 듣기에 판소리를 그 자체로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젊은 친구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실 판소리가 어려운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낯선 것뿐이에요. 저도 클래식이 어려운 걸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엔 자신이 배울 게 너무 많아서 그저 현재에 충실하고 싶다는 캐시디 교수. 다만 자신과 함께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 초등학생 아들 기인이와 가까운 시기에 무대에 오르고 싶단다.
“얼마 전 친구 아버님 칠순잔치에 기인이와 같이 갔는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노래 부르라니까 판소리를 부르더라고요. 다들 신기하고 기특하다고 용돈도 챙겨주고 하니까 부쩍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엔 저보다 더 잘 부른다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자신과 같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소리를 알려주고 싶단다.
“외국인이 듣기에 판소리를 그 자체로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젊은 친구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실 판소리가 어려운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낯선 것뿐이에요. 저도 클래식이 어려운 걸요.”
<글·사진 권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