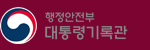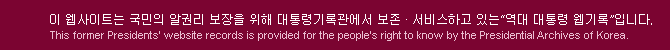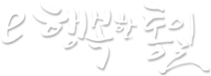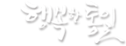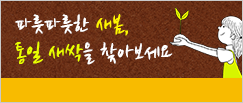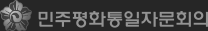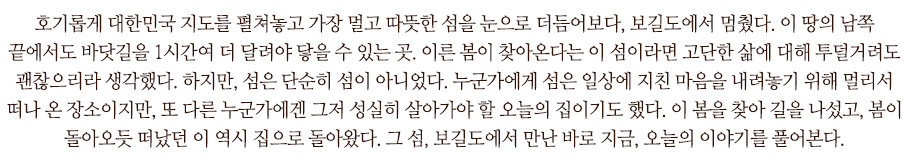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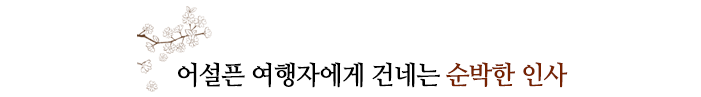
더 이상 섬이라 부르기에 어색해진 완도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느긋한 움직임으로 노화도에 닿자, 섬과 뭍을 오가던 사람과 차량들이 바삐 짐을 챙겨 길을 떠난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남겨진 여행자들 역시 주홍빛 보길대교를 따라 노화도에서 보길도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에 몸을 싣는다. 터덜터덜, 멀리 보이는 바다만 아니었다면 영락없이 시골동네인 작은 마을을 지나 드디어, 보길도다. 사실 섬에 대한 몇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삶의 터전이 척박한 만큼 낯선 이방인의 방문을 경계할 것이란 편견도 그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물이 좋기로 유명한 섬 주민들은 낯선 얼굴에도 곧잘 인사를 건네고, 투박한 몸짓으로 어설픈 여행자의 고단한 여행길을 동정하며 섬에 대한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을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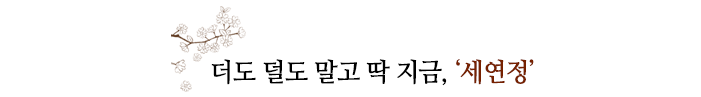

 동네 마실(‘산책’의 전라도 사투리) 나온 어르신이 ‘당췌 이 먼 데까지 뭐 땀시 왔는지 모르겠다’고 끌끌 혀를 차며 손끝으로 가르쳐 준 방향을 따라 씩씩하게 걸어 도착한 곳은 보길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윤선도 원림이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장가였던 고산 윤선도는 물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일컬어 다섯 친구라 부르며 무려 13년간 이 섬에 머무르는 동안 대표작인 ‘어부사시사’를 지었다. 시와 풍류를 즐겼던 문인답게 운치 있는 풍광마다 흔적을 남겼는데, 가장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이 원림의 세연정이다.
동네 마실(‘산책’의 전라도 사투리) 나온 어르신이 ‘당췌 이 먼 데까지 뭐 땀시 왔는지 모르겠다’고 끌끌 혀를 차며 손끝으로 가르쳐 준 방향을 따라 씩씩하게 걸어 도착한 곳은 보길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윤선도 원림이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장가였던 고산 윤선도는 물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일컬어 다섯 친구라 부르며 무려 13년간 이 섬에 머무르는 동안 대표작인 ‘어부사시사’를 지었다. 시와 풍류를 즐겼던 문인답게 운치 있는 풍광마다 흔적을 남겼는데, 가장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이 원림의 세연정이다.
깊은 산에서 흘러내려 온 물이 고인 연못 가운데에 세워진 정자, 세연정의 절경을 느끼고 싶다면 정자에 오롯이 앉아보길 권한다. 학의 날개마냥 뽀얀 창호문을 접어 올린 정자 안에서 내다본 이 계절의 풍경은 더도 덜도 말고 딱 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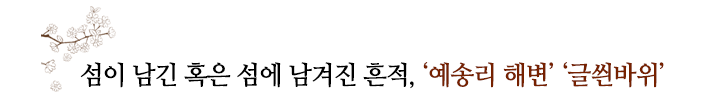
고산만큼이나 이 아담한 섬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 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우암 송시열이다. 조선후기 정치계와 사상계를 호령했던 우암 선생은 83세의 나이에 제주로 유배를 가던 중 이곳에 우연찮게 들려 오언절구 시를 바위에 남겼고, 후에 제자가 그 글을 바위에 새겨 지금의 ‘글씐바위’가 됐다. ‘글씐바위’를 찾아 섬의 동쪽을 따라 달리다보면 고운 모래사장이 미인의 눈썹처럼 곱게 휘어진 통리해수욕장과 중리해수욕장, 예송리 해변 등을 지나게 된다. 섬이라지만 산이 깊고 수원지까지 있어 물이 좋다는 섬에서는 해변 주변으로도 어렵지 않게 잘 뻗은 송림을 만날 수 있다. 우암 선생의 ‘글씐바위’는 보길도 백도리 바닷가 근처 바위에서 구경할 수 있는데, 오래된 글귀만큼이나 그 앞으로 펼쳐진 탁 트인 남도의 바다풍광 역시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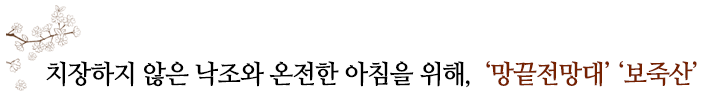
 자연의 순리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섬마을의 밤은 이를 수밖에 없다. 어물어물 저물어가는 태양이 아쉬워 지나가는 섬 주민 붙잡고 일출과 낙조로 유명한 곳을 묻자 입이라도 맞춘 듯 보죽산과 망끝전망대를 손꼽는다. 다도해 앞바다, 날씨만 좋다면 멀리 제주도까지 서로 다른 개성의 섬들이 내려다보이는 망끝전망대에서는 치장하지 않은 낙조를 볼 수 있으며, 흔히 ‘뽀족산’이라고도 불리는 보죽산의 산등성이에서는 온전한 ‘아침’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전복, 김, 다시마 등의 특산물이 유명한 지역답게 짙푸른 하늘 아래, 꼭 그만큼 푸른 물색을 지닌 바다 위에는 어김없이 가두리 양식장이 자리하고 있어, 특별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자연의 순리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섬마을의 밤은 이를 수밖에 없다. 어물어물 저물어가는 태양이 아쉬워 지나가는 섬 주민 붙잡고 일출과 낙조로 유명한 곳을 묻자 입이라도 맞춘 듯 보죽산과 망끝전망대를 손꼽는다. 다도해 앞바다, 날씨만 좋다면 멀리 제주도까지 서로 다른 개성의 섬들이 내려다보이는 망끝전망대에서는 치장하지 않은 낙조를 볼 수 있으며, 흔히 ‘뽀족산’이라고도 불리는 보죽산의 산등성이에서는 온전한 ‘아침’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전복, 김, 다시마 등의 특산물이 유명한 지역답게 짙푸른 하늘 아래, 꼭 그만큼 푸른 물색을 지닌 바다 위에는 어김없이 가두리 양식장이 자리하고 있어, 특별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보통 여행자라면 ‘깻돌’이라고도 불리는 보옥리 근처의 공룡알 해변의 매끈한 자갈 위에 걸터앉아 시간을 보낸 후 보죽산에 오르기 쉬운데, 등산로가 마련된 것이 아니라 길의 경사도가 높으므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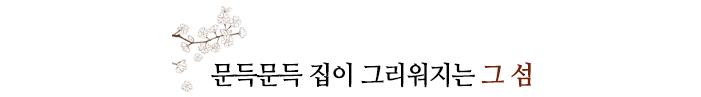
옛 뱃사람들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마파람’이 불 때면 노를 젓지 않고도 제주를 갈 수 있다고 할 만큼 제주와 인접한 보길도는 언뜻 제주의 풍경과 비슷하다. 낮은 돌담과 이르게 터트린 봄꽃의 향연도 그렇고, 무엇보다 떠나온 이들에겐 관광지이지만 살아가는 이들에겐 삶의 터전이란 점이 닮아있다. 솜털 같은 털을 가진, 집 나간 강아지를 잡아달라는 어르신의 요청에 한참 실랑이를 하고도 변변치 못하다 핀잔을 듣고, 동네 유일의 점빵(‘가게’의 사투리)에서는 계산도 포장도 손님 몫이 당연하다. ‘어디서 왔는지’는 물어봐도 ‘어디로 갈지’는 궁금해하지 않는 섬마을은 문득문득 떠나 온 ‘집’을 떠올리게 한다. 쉬이 다시 찾기 먼 곳이기에 다시 오란 말 대신 조심해서 가라는 인사말이 건네는 사람들과 섬을 등지고, 그사이 부쩍 그리워진 ‘나의 집’으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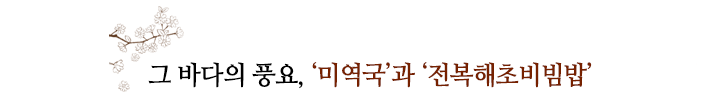
 섬이라고는 하지만 항구주변으로는 제법 반듯한 모텔이나 숙소도 적지 않지만, 지역의 특산물로 소박하게 차린 아침밥상을 받고 싶다는 욕심에 일부러 민박집으로 향한다. 미역으로 뭉근하게 끓여낸 깊은 맛의 미역국과 동네주민이 직접 말리고 구웠다는 조미김, 멸치젓갈, 이 계절의 해초류로 차려낸 밥상은 그 자체로 바다내음이 물씬 풍긴다. 특색 있는 전복 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싱싱한 전복에 해초류를 가득 담아 슥슥 비벼 먹는 전복해초비빔밥을 추천한다.
섬이라고는 하지만 항구주변으로는 제법 반듯한 모텔이나 숙소도 적지 않지만, 지역의 특산물로 소박하게 차린 아침밥상을 받고 싶다는 욕심에 일부러 민박집으로 향한다. 미역으로 뭉근하게 끓여낸 깊은 맛의 미역국과 동네주민이 직접 말리고 구웠다는 조미김, 멸치젓갈, 이 계절의 해초류로 차려낸 밥상은 그 자체로 바다내음이 물씬 풍긴다. 특색 있는 전복 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싱싱한 전복에 해초류를 가득 담아 슥슥 비벼 먹는 전복해초비빔밥을 추천한다.
<기사/사진. 권혜리>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