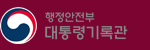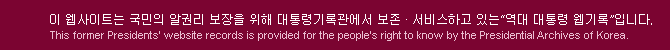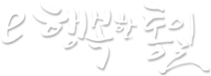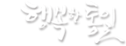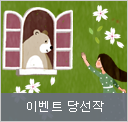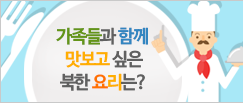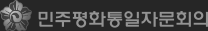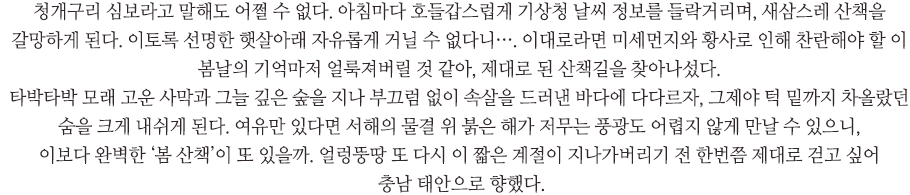

무거워진 몸을 주체하지 못해 잔뜩 내려앉은 하늘 아래, 바다를 등진 사막이 있다. 봄 햇살에 적당히 데워진 바람이 불어올 때면 반짝이는 고운 모래들이 파도처럼 흘러내리는 야트막한 사막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구(砂丘)인 신두리 해안사구다. 무려 빙하기 이후부터 바람에 의해 침식과 퇴적을 반복해 만들어진 사구는 사구식물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삶의 터전이자, 국내 해안사구의 모든 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다. 하지만, 그런 전문적인 사전 지식이 없다 해도, 바다 뒤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사막과 사막 앞으로 펼쳐진 숲의 전경 앞에서는 쉬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이른 새벽, 3km의 해변에 해무가 내려앉는 날이면 하늘과 바다, 모래사막과 숲의 경계가 모호하게 지워진다. 문득 세상 속 홀로 남은 듯 적막감에 어깨를 움츠리기도 잠시, 바람이 스쳐가는 파도와 나뭇잎의 부대낌에 귀를 기울이면 지워진 경계만큼 마음 역시 자유로워진다. 또 해질녘 풍광 또한 일품이라 아침 잠이 많은 이들이라면 오히려 한껏 게으름을 피워도 좋다.
다만, 중요한 자연의 보고인 만큼 직접 사구를 오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주변의 잘 정돈된 나무테크를 이용하거나 해변 쪽 사구를 구경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랜다. 그리고 이 봄이 지나 계절이 더 무르익어 가면 얼마 안 가 푸른 풀밭으로 뒤덮인 사구 역시 만날 수 있다.

이름난 해변이 많은 지역답게 태안 하면 서해 특유의 광활한 갯벌과 잘 정돈된 바다풍광을 떠올리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아기자기한 걷기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바다를 둘러싼 숲과 그 숲길에서 만난 꽃송이들이다.
기어이 제 흔적을 남긴 사막의 고운 모래알 몇 알을 옷자락에 묻힌 채 이번엔 짙푸른 나무 사이를 거닌다. 태생은 사람의 손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성껏 가꿔진 수목원의 나무와 꽃들은 어느새 가장 이 땅과 어울리는 생김새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천리포수목원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수목원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중 한 곳이다.

 봄날, 만개한 꽃송이가 겹겹이 꽃잎을 포갤 때, 버드나무가 연못 위 긴 나뭇가지를 떨궈낼 때 수목원의 풍경은 더욱 풍요로워 진다. 사실 430개 품종의 목련이 이름난 곳이지만, 목련이 진 자리는 청초한 수선화와 수목의 생기가 대신하기에 봄날이라면 언제고 찾아도 후회가 없다. 사실 식물자원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학술적인 목적이 더 큰 곳이다 보니 일반관람객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적이다. 하지만, 지역의 풍광에 반해 평생을 이 땅의 식물과 꽃을 키우는데 헌신했다는 설립자의 마음이 십분 이해될 만큼, 바다를 끼고 이뤄진 수목원의 풍광은 그 자체로도 황홀하다. 특히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놓인 벤치에 앉아 멀리 천리포해수욕장을 보고 있자면 가능한 이 봄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남몰래 기도하게 된다.
봄날, 만개한 꽃송이가 겹겹이 꽃잎을 포갤 때, 버드나무가 연못 위 긴 나뭇가지를 떨궈낼 때 수목원의 풍경은 더욱 풍요로워 진다. 사실 430개 품종의 목련이 이름난 곳이지만, 목련이 진 자리는 청초한 수선화와 수목의 생기가 대신하기에 봄날이라면 언제고 찾아도 후회가 없다. 사실 식물자원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학술적인 목적이 더 큰 곳이다 보니 일반관람객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적이다. 하지만, 지역의 풍광에 반해 평생을 이 땅의 식물과 꽃을 키우는데 헌신했다는 설립자의 마음이 십분 이해될 만큼, 바다를 끼고 이뤄진 수목원의 풍광은 그 자체로도 황홀하다. 특히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놓인 벤치에 앉아 멀리 천리포해수욕장을 보고 있자면 가능한 이 봄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남몰래 기도하게 된다.

 사실 태안의 해변에 대한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 까닭은 그저 흔하기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사람의 변덕스러움을 탓해야 할 문제지, 올망졸망 이어진 크고 작은 해변들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이맘때 태안의 바다는 인파에 시달리지 않고 너른 바다를 느긋하게 조망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그중에서도 꽃지해수욕장 초입은 더욱 특별하다.
사실 태안의 해변에 대한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 까닭은 그저 흔하기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사람의 변덕스러움을 탓해야 할 문제지, 올망졸망 이어진 크고 작은 해변들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이맘때 태안의 바다는 인파에 시달리지 않고 너른 바다를 느긋하게 조망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그중에서도 꽃지해수욕장 초입은 더욱 특별하다.
선명한 원색의 유채꽃무리가 넘실대는 바다는 그 자체로 봄을 상징한다.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지금 서있는 이 계절이 봄이란 사실에 고단한 일상을 핑계로 딱딱하게 굳어가던 심장마저 말랑말랑 설레기 시작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란 꽃무리는 단순히 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두 손을 꼭 잡은 노부부가 몇십 년 전 어느 봄날을 추억하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얼굴에도 열일곱 소녀 같은 미소가 번진다. 그렇게 이 바다 앞 꽃밭은 또 다른 이름의 추억이 된다.
조금 더 낭만적인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근흥면 일대의 갈음이해수욕장 주변으로 향해본다. 구름이 주홍빛으로 물들어가는 시간,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속 주인공들이 해질 무렵 허밍에 맞춰 왈츠를 췄던 울창한 솔숲과 모래가 곱기로 유명한 백사장으로 걷다 보면 자꾸만 심장이 간지러워진다.


간질간질한 심장을 토닥토닥 다독이며, 이번엔 좀 더 바다 가까이 다가가 본다. 일몰이 아름답기로는 손꼽힌다는 간월도 물때에 따라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밀물이 차오르면 그대로 작은 섬이 되지만, 물이 빠지면 바닷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간월도에 위치한 간월암은 조선시대 무학대사가 수행했다는 작은 암자로 긴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 조금은 투박한 모습이지만, 주변으로 흐드러진 유채꽃과 뜨거운 태양을 꿀꺽 삼켜내는 낙조의 풍광만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사실 행정구역상 인접 지역인 서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태안의 해변 길을 달리다보면 쉽게 닿을 수 있으니 한번쯤 함께 둘러볼 만하다.


 싱싱한 해산물을 푹 끓여 낸 국물의 첫맛은 진하고 달큰하며 김치의 칼칼함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 생각을 간절하게 만든다. 이름조차 생소한 게국지는 서해 앞바다에서 건져올 린 싱싱한 꽃게에 겉절이 김치를 더해 끓여내는 충남 지역의 향토음식이다. 낯선 이름과 달리 맛은 친숙하고 정겨워 금세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운다. 여기에 매콤한 양념게장과 짭짤한 간장게장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 든든하게 배까지 채우자 이 봄이 조금 더 행복해진다.
싱싱한 해산물을 푹 끓여 낸 국물의 첫맛은 진하고 달큰하며 김치의 칼칼함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 생각을 간절하게 만든다. 이름조차 생소한 게국지는 서해 앞바다에서 건져올 린 싱싱한 꽃게에 겉절이 김치를 더해 끓여내는 충남 지역의 향토음식이다. 낯선 이름과 달리 맛은 친숙하고 정겨워 금세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운다. 여기에 매콤한 양념게장과 짭짤한 간장게장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 든든하게 배까지 채우자 이 봄이 조금 더 행복해진다.
<글 / 권혜리, 사진 / 김규성>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