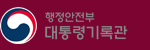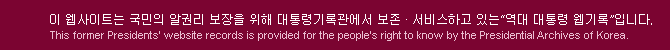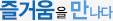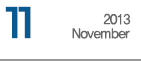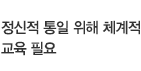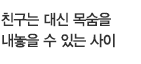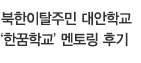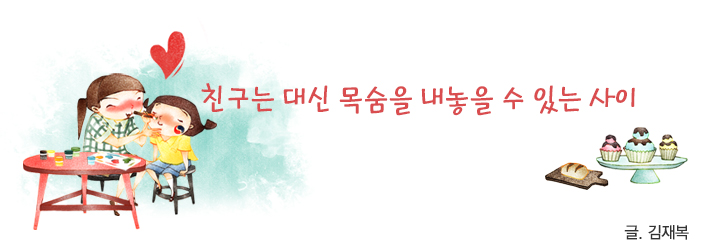
러시아의 어느 도시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제 또래의 스무 살 북한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하얀 얼굴에 해맑게 웃는 친구였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분위기 속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말 차근차근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이라는 연습문구조차도 읽기를 거부하는 것이 이해도 안 됐고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앓아누웠을 때 제 방을 쭈뼛쭈뼛 찾아와 간식을 한 아름 안겨주던 그 친구. 그 아이와 저는 전화통화를 할 때면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이야기해야 했고, 같이 타려는 버스에 혹여나 북한 사람이 타고 있을 때면, 그 친구는 절대 타지 않았습니다.
한참 북의 전쟁 도발로 인해 긴장감이 팽팽할 시기, 전쟁이 나면 북으로 돌아갈 것이냐
묻는 질문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하다’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자기는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없다’며 방방 뛰었습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났다면
저희는 서로 총을 겨누는 사이가 되었겠죠. 그런 상상을 했을 때는
정말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친구인데.
며칠 뒤, 철학 수업 중에 저는 예문으로 '북한과 남한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한민족이고 분명 서로를
너무나 보고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렇게 서로에게 아직도 총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업 후 북한친구가 어떤
의미였냐고, ‘남조선’ 사람들은 ‘북조선’을 적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적이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북한사람들은
미국 때문에 한국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에 대한 설명과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부고위 관리이고 분명 모든 걸 알고 있을 테지만 그의 아들은 우물 안
개구리라 해야 할까요. 어린 그에게 아직 현실을 알려주기에는 무리였나 봅니다.
평양에서 부유하게 자란 친구는 북한이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화려한 도시, 천국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차마 그 친구에게 북한에 대한 사실을 얘기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저 얘기를 들어주며 맞장구 쳐주곤 했습니다.
묻는 질문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하다’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자기는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없다’며 방방 뛰었습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났다면
저희는 서로 총을 겨누는 사이가 되었겠죠. 그런 상상을 했을 때는
정말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친구인데.
며칠 뒤, 철학 수업 중에 저는 예문으로 '북한과 남한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한민족이고 분명 서로를
너무나 보고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렇게 서로에게 아직도 총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업 후 북한친구가 어떤
의미였냐고, ‘남조선’ 사람들은 ‘북조선’을 적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적이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북한사람들은
미국 때문에 한국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에 대한 설명과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부고위 관리이고 분명 모든 걸 알고 있을 테지만 그의 아들은 우물 안
개구리라 해야 할까요. 어린 그에게 아직 현실을 알려주기에는 무리였나 봅니다.
평양에서 부유하게 자란 친구는 북한이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화려한 도시, 천국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차마 그 친구에게 북한에 대한 사실을 얘기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저 얘기를 들어주며 맞장구 쳐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헤어져야 할 날이 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고, 마지막으로 작별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는 친구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친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왔고, 북한에서
친구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이’라는 뜻이고 보통은 ‘동무’라 칭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살짝 머쓱해진 나는 '그래 동무,
언젠가 꼭 만나자' 라는 말을 남기며 돌아섰습니다.
그 뒤에 대고 그는 웃음을 머금은 듯한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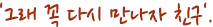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고, 마지막으로 작별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는 친구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친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왔고, 북한에서
친구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이’라는 뜻이고 보통은 ‘동무’라 칭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살짝 머쓱해진 나는 '그래 동무,
언젠가 꼭 만나자' 라는 말을 남기며 돌아섰습니다.
그 뒤에 대고 그는 웃음을 머금은 듯한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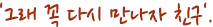
북한과 남한사이에는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너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사상차이. 하지만 서로에게 동무 심지어는 친구가될 날이 언젠가는 꼭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멀게만 느껴지던 저는 그 북한 친구와의 운명 같은 만남으로 인해,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너무나 바라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 20년 혹은 100년 뒤에 통일이 되었을 때, 그 친구를 만날 날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사상차이. 하지만 서로에게 동무 심지어는 친구가될 날이 언젠가는 꼭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멀게만 느껴지던 저는 그 북한 친구와의 운명 같은 만남으로 인해,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너무나 바라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 20년 혹은 100년 뒤에 통일이 되었을 때, 그 친구를 만날 날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