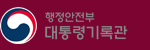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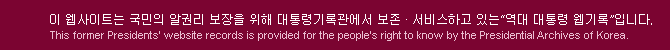 |
즐거운 통일 | 여행이 문화를 만나다
여행이 문화를 만나다

깊은 어둠의 끝에서 단숨에 시야로 쏟아져 들어온 빛 무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어이 눈을 잠시 감았다 떠야했다. 그야말로 순백(純白)의 세상. 잠시의 공백도 견디지 못해 조바심 내던 눈송이들이 진한 겨울에 제 흔적을 남기는 모양새를 따라하듯 순결한 눈길 위로 힘주어 발자국을 남겨본다. 숨소리 한 번에도 나폴나폴 흩어지는 눈꽃을 따라 떠난 원주의 겨울은 청명하고 고요했다.
소박하지만 온건한 온기, ‘용소막성당’
듬성듬성 펼쳐진 논밭과 올망졸망한 시골마을 그리고 이따금 등장하는 콘크리트의 건물 숲, 원주는 전형적인 지방 중소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희끗한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이 깊어질수록 도심은 더 없이 서정적인 얼굴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 동화 같은 겨울 풍경의 한 쪽에는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아담한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누군가 겨울의 원주를 찾는다면 꼭 한 번 들려보라 추천해줬던 성당의 첫 인상은 소박하지만 온건했다.
여러 번 흔들어 놓은 스노우볼 속 세상처럼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면 성당 주변의 150여 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느티나무 가지 위로 눈꽃이 피었다 사라지길 반복한다. 1904년 설립됐다는 성당은 첫 인상만큼이나 내부의 모습 또한 아늑했다. 종교를 떠나 긴 세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장소는 추위에 얼어붙었던 손끝이며 두 뺨을 살그머니 녹여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제 온도를 찾기 시작한 손가락 끝부터 시작해 심장까지 간지러워진다.
성당 주변에는 울창한 송림과 더불어 유물관도 자리하고 있다. 유물관에서는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성경을 한글과 영어는 물론 라틴어, 독일,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 버전으로 관람할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 된다.
설국(雪國)의 고요, 뮤지엄 ‘산’
 쉼 없이 쏟아지던 눈발의 기세가 누그러질 쯤 안온한 온기를 품은 성당을 뒤로 하고, 더 고요한 설국(雪國)으로 향한다. 치악산 인근 스키장이 위치할 만큼 높은 지대에 위치한 미술관이 가까울수록 도심의 분주함이 멀어져간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꼬박 8년의 세월을 거쳐 지었다는 뮤지엄 ‘산’은 그 안팎 어느 한곳 공들이지 않은 곳이 없다. 월컴센터를 지나 본관으로 이어지는 길목은 시시각각 물들어가는 계절의 변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봄·여름이면 온순한 꽃잎이 흐드러지고, 가을엔 붉게 달아오른 단풍을 곱다는 곳으로 발을 내딛는다.
쉼 없이 쏟아지던 눈발의 기세가 누그러질 쯤 안온한 온기를 품은 성당을 뒤로 하고, 더 고요한 설국(雪國)으로 향한다. 치악산 인근 스키장이 위치할 만큼 높은 지대에 위치한 미술관이 가까울수록 도심의 분주함이 멀어져간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꼬박 8년의 세월을 거쳐 지었다는 뮤지엄 ‘산’은 그 안팎 어느 한곳 공들이지 않은 곳이 없다. 월컴센터를 지나 본관으로 이어지는 길목은 시시각각 물들어가는 계절의 변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봄·여름이면 온순한 꽃잎이 흐드러지고, 가을엔 붉게 달아오른 단풍을 곱다는 곳으로 발을 내딛는다.
보드라워 보이는 눈밭을 제외하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높낮이가 다른 산등성이 뿐. 오롯이 마주한 겨울은 춥고, 적막하고 평온했다. 숨소리마저 차분해지는 공간 속 비워내고자 하는 의지조차 비워진 가슴 위로 새하얀 눈송이가 쌓여간다. 그리고 행여 펼쳐진 눈밭을 밟을 까 조심스레 발길을 옮겨 키 큰 자작나무 숲 사이를 지나면 그제야 본관이 시야에 들어온다.
세련된 미술관 외관에 주춤하기도 잠시 추위에 쫓겨 들어선 갤러리 내부는 상상만큼 어렵거나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미술관의 전신이 종이 전문 박물관이었던 만큼 옛 감성을 떠올리게 하는 공예품과 전적류의 상설전시를 비롯해 신라 고분을 모티브로 한 스톤가든, 빛과 공간의 예술가 제임스 터렐의 특별전 등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전시관과 전시관 사이의 복도마다 벤치를 두어 통 창문 너머 풍경을 오래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콘크리트 내벽에 등을 대고 앉아, 차분히 겨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면, 한파를 핑계로 투덜댔던 것이 미안할 만큼 흘러가는 계절이 아쉬워진다. 이 계절의 끝에 새 계절이 오고, 그리하여 다시 겨울이 찾아온다 해도 오늘의 이 겨울은 아닐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제를 살아간 그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박경리문학공원’
그렇게 하루 종일 지치도록 바라본 하얀 설경 덕분일까 조급증으로 인해 시시때때로 덜컹대던 심장과 과부화 상태였던 머릿속도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쉽게 달아오르고 식기를 반복했던 감정이 느슨해진 틈을 타 학창시절 좋아했던 여류 작가의 흔적을 쫓아 원주 시내로 향해본다.
파란만장한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러 계층의 이야기를 담아낸 대하소설 ‘토지’. 이제는 고인이 된 작가 박경리가 장장 25년에 걸쳐 집필한 토지의 마침표를 찍은 곳이 바로 원주이며 그래서 이곳에는 작가의 옛 집과 작가의 이름을 딴 문학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밭을 일구고 글을 썼다는 작가의 소박한 일상이 그대로 묻어나듯 옛집과 문학공원 어느 쪽도 소박한 규모를 자랑한다. 그래도 ‘토지’ 속 배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3개의 테마 공원과 죽기 전 여생의 마지막을 보냈다는 옛 집에서는 친필 원고 등을 관람할 수 있어 한번쯤 들러볼 만하다.



<취재: 권혜리 / 사진: 김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