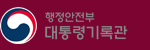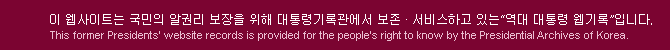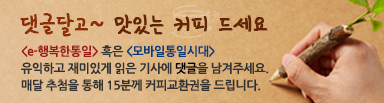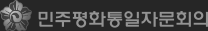오바마의 대중정책 변화
견제와 관여 그리고 둘을 섞은
헤징(Hedging)으로 중국을 다스린다
 헤어지는 오바마(오른쪽)와 시진핑. 2014년 중국 베이징 옌치후 APEC 회의장에서 지금의 미·중 대립처럼 두 사람이 묘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헤어지는 오바마(오른쪽)와 시진핑. 2014년 중국 베이징 옌치후 APEC 회의장에서 지금의 미·중 대립처럼 두 사람이 묘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중국의 굴기에 대해 미국은 재균형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큰 틀 위에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이 어떠한 대중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북핵 문제도 변화한다.
미·중관계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이 부쩍 중국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중국도 이에 질세라 사안마다 매우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미·중 전략·경제대화(Security and Economic Dialogue)는 양국의 외교·경제 수장들이 모여 난제를 풀어가자는 자리다. 8년째를 맞이한 올해 대화에서 양국 대표는 대북정책, 남중국해, 무역 및 환율정책 등에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가시 돋친 설전만 주고받았다.
이러한 대립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대화를 채 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은 중국의 대표적 민간기업인 화웨이에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 제재 대상국가와 거래한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과 거래한 중국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2차 제재(Secondary Boycott)’가 가능함을 시사한 것이다. 5월 말 일본에서 개최된 G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회담은 반(反)중국연대 성격을 띠었다.
미국의 대중(對中)정책은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국이 주도한 대북 제재에 동참해 적어도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미·중관계가 대립으로 치닫고 있으니 대북 제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인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정책 변화를 추적하며 미·중관계와 미국의 한반도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견제와 관여를 혼용한 ‘헤징정책’으로 대응
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두어왔다. 테러와의 전쟁과 중동 문제에도 많은 외교정책 자원을 투여해왔지만 역시 초점은 중국의 부상이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발간된 미국 정부 문서들을 보면 중국이 역내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온 정책은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다. 미국의 군사력을 투사하거나 투사 위협을 가해 대응하는 ‘견제정책’이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기에 직접적인 견제보다는 역내 동맹관계를 활용해 동맹 파트너로 하여금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한다. 이러한 정책을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이라고 한다. 이 정책은 냉전시대의 봉쇄(Containment)와 궤를 같이하는 현실주의적 외교정책 전통에 기반을 둔다.
다른 하나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만들어 중국의 부상을 관리해야 한다는 ‘관여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을 세계화(Globalization)된 국제 경제 질서의 축 안에 편입시켜야 한다
. 중국의 정치 자유화를 장려하고, 중국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 만들어야 한다. 이 정책은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민주주의와 국제사회의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외교정책 이론에 근거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견제와 관여정책을 적절히 혼용한 ‘헤징(Hedging)’ 정책으로 중국 부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중국 외교의 주류를 형성해왔다. 공화당 행정부가 견제정책을, 민주당 행정부가 관여정책을 선호한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정도의 문제였다. 양당 모두 헤징전략을 구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주최한 G7 회담에 참석했다가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미국이 원폭을 투하했던 히로시마를 방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일본이 주최한 G7 회담에 참석했다가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미국이 원폭을 투하했던 히로시마를 방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공화당 행정부가 친일노선을, 민주당 행정부는 친중 성향을 보여왔지만,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미·일동맹을 활용해 대중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래도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로 인식하며 협력을 도모한 반면,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인식하고 공세적인 대중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집권 초기인 2009년 오바마의 대중 인식은 클린턴과 유사했다. 2008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오바마는 인류 ‘공통의 인도주의(Common Humanity)’를 위한 ‘공통의 안보(Common Security)’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부시가 중국 같은 특정국가에서 오는 전통적인 안보 위협을 강조했던 것에 비해 오바마는 안보 위협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기후변화나 대기오염, 테러리즘과 같은 포괄적이고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오바마의 대중정책은 2009년 말, 2010년 초 강경노선으로 선회했다.
그러한 선회는 공세적으로 변한 중국의 대미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위기 때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중국은 기존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기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외교정책인 ‘유소작위(有所作爲)’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경제 개발 모델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비판하며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의 우월성을 설파한 것이다.
미 재균형 정책 동맹국 도움 필요해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 통치 모델의 우월성으로 확장 해석돼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만 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비판하는 데 동원되기도 했다.
그리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도서 영유권 문제에서도 중국은 매우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으로 대응했다. 강경해진 오바마 정부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자 중국은 국력 차를 실감하고 공세적 외교정책을 수정하며 내실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동시에 중국은 ‘회귀(Pivot)’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군사적 의미를 부각하며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은 중국 봉쇄정책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아시아 회귀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며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시아 재균형은 군사정책이 아니라 외교·경제·문화정책을 아우르는 다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재균형 정책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중국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중국 견제정책으로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재균형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미국이 갖고 있는 아·태지역 동맹국의 의미는 각별하다. 미국은 아시아의 중요한 이해 당사국임에 틀림없지만, 엄밀히 따지면 역외국가이다. 중국의 급부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미국이 재균형 정책을 펼치려면 동맹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며,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 ‘핵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의 철학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미·일 간 역사 문제를 털어내고 대중정책에서 공조를 추진하자는 전략적 제스처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 진입시킨 핵 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 미국은 역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지만 대결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남중국해에 진입시킨 핵 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 미국은 역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지만 대결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미·중관계 관리를 한반도 위기관리보다 더 중시
그렇다면 악화된 미·중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가. 미국이 아시아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재균형 목표를 달성하려면 규율적(disciplined)이지만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미·중관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길들이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지양해왔다. 중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과 환율 조작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제1교역국가(중국)와의 경제관계가 파탄 나는 상황은 피해온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합치해 대중정책에서 우선이 된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중국 주변국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분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만 그러한 역내 분쟁으로 중국과 군사적 마찰이 일어나는 상황을 막으려는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의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중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정책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웨이에 2차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실제로 2차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최근의 ‘중국 때리기’는 2016년 미국 대선의 국내정치적 역학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정황의 안정적 관리’는 미국의 한반도정책에서도 우선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한국과 보조를 맞춰가며 북한을 강력히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미·중관계 관리와 한반도의 위기관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면,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상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이 급변하는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 조용히 다양한 북핵 협상 시나리오를 검토해보고 우리의 선택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 예일대 정치학박사. 예일 국제지역학센터 연구원,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역임. 현재 국제정치학회 외교정책분과 위원장, 사단법인 코리아평화봉사회 이사장,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저서 <CIA 블랙박스>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