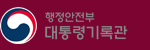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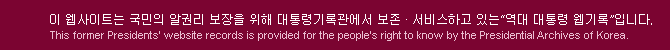 |
88호 > 통일칼럼
통일칼럼
미국은 2010년 3월 30일 북한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1997년 망명, 2010년 10월 사망)를 초청했다. 당시 황 전 비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북한은 인민의 절반이 굶어 죽어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간 북한의 핵카드에 대응해 이를 무력화하는 ‘핵 포기’ 전략과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되 안정적인 관리하에 두는 ‘핵보유국 인정’ 전략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던 미국은 이후 점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황 전 비서의 증언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분명하게 확인됐다.
이번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과 다름없는 지위를 갖게 됐다. 견해가 분분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전문그룹은 이번의 핵실험 규모가 진도 5.0, 폭발력 10kt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한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20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우리의 ‘비핵화’ 정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셈이다.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입장 변화 또한 한국에게 딜레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13년도 시정연설에서 비핵화 대신 비확산에 분명한 무게를 두었고, 오바마 제2기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척 헤이글은 지난 1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실제 핵보유국(Real Nuclear Power)’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정책적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정책 목표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이 북한 정책을 놓고 정교하게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북한 핵에 대한 최종 해법은 우리의 몫이다. 사실상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핵 제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북핵을 북한 체제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로드맵을 마련해 포괄적 억지력을 구축함으로써 ‘비핵화 효과’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북한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민생과 경제 등 현실적인 국가 이익과 국가 목표를 우선할 경우 사실상의 ‘비핵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3차 핵실험은 철저하게 군부의 작품으로 현재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 민생파는 핵실험 주도 세력에서 빠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부에게 핵(실험)은 양날의 칼이다. 군부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지만 한번 쓰고 나면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핵 카드가 힘을 잃는다면 반대로 북한에서 당 중심의 민생파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확대된다. 북한 군부는 3차 핵실험 후 또 다른 핵실험을 예고했다. 그러나 핵실험에는 횟수에서부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민생파가 본격 나설 시점이 멀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을 이끌고 있는 당정파는 ‘경제’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의 위상을 확보한 만큼 향후 민생 경제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막후에서 이를 총괄하는 장성택 부위원장은 한국을 경협의 최고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는 단호하면서도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협과 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만일 남북 경협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이 민생과 경제에 더 매진한다면 한국의 대북 영향력은 더 확대될 수 있고 그만큼 ‘비핵화 효과’도 앞당겨지고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